젊은이는 규칙을 알지만 노인은 예외를 안다.
uuoldb시도 공산품이라는 사실을 제작공정을 보고서야 알았다. 문화센터
tumnrv조립하고 있었다. 누군가 앙상한 시의 뼈대를 내밀었다. 곰 인형이나
kxi2조각보를 마름하듯 깁고 꿰매고 잘라 내고 덧붙이며 간간이 웃음과 농
9d5g담도 섞으며 정성스레 매만지는 손길들이 골똘하고 따스했다.
xmwo시는 머릿속에서 튕겨 나오는 게 아니고 몸속 여기저기를 흘러 다니다
kmr04e가 손끝으로 감실감실 새어 나오거나 앞 문장의 끄트머리를 붙들고 절
7mpv름절름 걸어 나오는 거라고, 스티치 위에 인두질을 하고 반짝이 가루
xjk2e뼈가 엉긴 곳에 섬세한 칼끝을 찔러 넣으며 시의 긍경을 맞추어 내는
nu0o솜씨가 포정해우?의 고사를 생각나게 하였다.
m4sr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물속에서 고요히 부화되어 나오는 줄 알
mj72았던 나는 일순 살짝 맥이 풀렸다. 영혼도 팔 할은 남의 것, 시만 오
21w3y도 돌보지 않는 고독에 바치는 것이라 했거늘, 고독도 돌봐 줘야 시가
gi8k되는 모양이다.
mjkk44엉겁결에 수필에 발을 들이고 몇 권의 책을 내는 동안 간간이 시를 흘
mco5끔거렸다.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첫사랑 소녀를 그리워하기도
dfw7t삼박사일, 오박육일 현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싶었다. 맘가는 마
x5rx3n둔 불임의 자궁 뜨겁게 달구어 숨풍숨풍 새끼들을 싸지르고 싶었다.
mo62d바람 든 여인네처럼 들썽들썽 기웃대기도 했다. 잘빠진 새끼들 펑펑
p3w5쏟아 내면 늙다리의 바람기도 용서 받을 것 같았다.
zg64d이저 함부로 집적거리다 겁도 없이 내질러 놓은 사생아 같은 시편
2gc0m들. 향기도 없고 여운도 없었다. 에스프리는 더더욱 없었다. 시란 몸
gw77t안에 서식하는 물음표들을 말쑥한 느낌표로 뽑아 올리는 작업이겠으나
m214내 안에 유숙하는 질문과 회의들은 어둡고 컴컴한 구절양장 같은 산
7dz3w핏덩이들을 아무도 몰래 유기해 버리곤 했다.
3p8ofh어렵게 착상이 되었으나 빛도 보지 못하고 유산된 시의 유혼들이 밤마
pcxof다 베갯머리를 어지럽혔다. 시도 아니고 산문도 아닌 글들, 이 맛도
zglt5어렵다기로 양다리를 꿈꾸다니. 더 이상 헤매다가는 돌아갈 길조차
dkdni9해 버렸다. 사십 년 짝사랑이 그렇게 멀어졌다. 내 충동적인 행각
q8rd39으로 무참하게 살해당한 시들을 애도하듯 함박눈이 푹푹 쌓이고 있었
kvs1분업과 협업, 아웃소싱을 거쳐 생산된 시가 만족스러운지 견습공이 꾸
lj0d벅 허리를 굽혔다. 주름진 얼굴에 번져 나는 무구한 웃음이 좋아 보였
57u4t다. 그러게, 사람아. 공산품이면 어떻고 수예품이면 어떠냐. 돈 냄새
2wvjms가며 산고를 치르고 있는데…. 시는 내 인생에 술 한잔 사주지 않았
emzwn)이 되고 싶어 줄기차게 제 안만 들여다보다가 시름시름 늙어 버린
o83c나는 가난한 시골집에서 태어났다. 피아노는커녕 쉽게 접할 수 있는
q0ur8냈다. 막내가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어서야 영화나 가곡 공연 관람
ihxzl어느 날, 혼자 아트홀을 향해 걸어가던 중이었다. 잠시 후 감상하게
7o8b자기 달려들었다. 나는 그만 아스팔트 길바닥에 나뒹굴고 말았다. 병
lzxb퇴원 후, 한약방을 경영한다는 여자 운전가가 집으로 찾아왔다. 보약
wlfj첫아이인 딸은 취학할 나이에야 피아노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집에
35y8돌아와서도 교본을 보며 멜로디언으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흉내
eut합해도 턱없이 모자랐다. 살림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비상금을
lxz7입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시내 피아노점에 가서 가격도 적당하고
quy8sl마음에 드는 모델을 골랐다. 그녀가 나서서 서울에 주문했다.
jpxf피아노가 거실 한쪽 벽 앞에 자리를 잡던 날, 내 심장은 마치 피아노
k3bf건반을 두드리는 듯 쿵쾅거렸고, 내 마음엔 건반에서 신비한 소리가
tlhyb나도 뻐꾸기가 되어 고향 뒷산의 포근한 둥지로 날아들었다. 그때가
p798ls우리 집 실내에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가 넘쳐나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
r3903딸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체르니 30번’을 치고 ‘바흐’를
qq0ct마지막으로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고 종합 학원에 등록했다. 막내인
wilhk히 배우지 않고 일찌감치 포기해버렸다. 피아노 소리가 점점 뜸해지면
nfeu3w서 거실의 밝은 기운도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는 그 집을 팔고 새로
filefz새 아파트 거실에 피아노를 들여놓았으나, 여고생이 된 딸과 중학생을
qs52l바라보는 아들은 피아노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덩치 큰 피아노가 자
1rt0l팔아버리자는 말을 꺼내곤 했다. 나는 매번 단번에 거절했다. 나로서
bzq8u담긴 그 피아노는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운데 보물 1호이자 두 아이에
xl4ld어느 날 중고 피아노 매매상을 불러들였다. 대세는 이미 기울어진 마
26sx5사라지는 피아노를 말없이 배웅했다.
f2de피아노를 판값으로 새 컴퓨터를 사들였다. 이번엔 아들의 요구를 들어
g7qozk주기 위해서였다. 컴퓨터에 한창 재미를 붙인 아들이 기능이 느린 구
8yzru8다. 이제, 피아노가 있던 자리에는 컴퓨터가 원래 제자리인양 버티고
6968앉아 있다. 피아노 수십 대의 건반이 출렁여야 할 자리에 컴퓨터 수십
plj7개의 자판이 활개를 치고 있다.
urjzr피아노가 없어진 지 십몇 년이 지났지만 불편을 느끼기는 고사하고 거
1sp9s의 잊다시피 살았다. 지금은 ‘정보의 바다’인 저 검은 물체가 없다
j0dq피아노는 엄마인 내가 두 자녀에게 기대한 꿈의 한 자락이었다. 오늘
ixum뒤뜰과 연결된 한지 문을 여니 연초록 감나무 잎사귀가 시야를 산뜻하
zi49p게 한다. 신발을 신고 내려서서 하늘을 바라본다. 잎새 사이로 비치는
txmt4햇살 조각이 눈부시도록 정겹다.
vfu61g모처럼 들른 친정집. 아버지가 생존해 계셨으면 돋아나는 대로 뽑아
774g하게 자라 있어 가슴을 아련하게 한다.
z4jxgq돌 틈으로 돋아난 풀을 조금밖에 뽑지 않았는데 땀이 흐른다. 난 두
16mf의 사랑은 항상 변함이 없으셨다.
b0f5fn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도 회식 자리까지 끝내고 오빠 집
llqbd내게 아버지는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이 눈만 깜빡거리며 누워 있으셨
zc10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어머니의 정성 어린 간호를 받으며 절룩
rhyev거리시는 몸으로 내려오신 뒤 침을 잘 놓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모
chj7rl시골화장실이 불편하여 신혼시절 우리 집에 머문 적이 있으시다. 생선
wbzf9l도 징그럽다며 요리하기를 꺼려하던 나였었다. 중풍에는 개고기가 좋
ttox오는 개다리를 돌리고 돌려 삶아 아버지께 드리곤 하였다.
g6fqq7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어쩌
fjbjld돌 틈의 풀을 다 뽑고 화단으로 올라서기 전 댓돌 위에 앉아서 잠시
327p무신 한 켤레가 보인다. 주인 잃은 지팡이와 고무신에는 뽀얗게 먼지
6iot반쪽을 못 쓰시니 오른발이 무감각인데다가 부었다. 구두는 엄두도 못
94x8w내고 운동화를 신으셨는데 신기도 불편하실 뿐더러 하루 종일 걸어
zcfbph때가 잘 탄다는 이유로 청색의 고무신으로 바뀐 뒤 외출하실 때만 하
rbhg1j얀 고무신을 신으셨다. 그러니 건강한 몸으로 외출할 때 신으셨던 구
e9ly4아버지는 고무신을 신고 지팡이에 의지하신 채 절룩거리며 아랫마을까
6m1fji지 다녀오는 것이 하루 일과였다. 그날 저녁 밥상에서는 어머니에게
1d0vzx당신의 평생 생활 터전이었던 논과 밭을 보며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9uvlq일하던 몸 건강하실 때의 모습을 회상하고 계셨던 건 아닌지.
hw95f주말을 이용하여 고추를 딸 때면 한 손으로라도 거들던 아버지. 길에
bz8vq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줍고 가로등을 시간 맞춰 켜고 끄는 것은 물
fej5m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면 어머니는 보던 드라마를 계속 보셔도 아버
cp6q7보일러 켜고 끄는 것도 아버지 몫이었으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내
vzqx4떨기까지 했다.
0ipym7고무신을 가만히 가슴에 안아 본다. 지금이라도 이 고무신을 신고 지
4p8vjt미소는 어디 가고 뒤뜰에 핀 함박꽃만 눈에 들어온다.
mo1l4h뒤뜰의 돌담이 담쟁이 넝쿨로 덮이고 함박꽃이 활짝 필 때면 감나무
xpgsf7부쳐 드리면 맛있다는 표시로 웃어 주시며 잡수시곤 하였는데…….
zuz9고무신을 들고 수돗가로 향한다. 대야 속에 잠긴 고무신을 보니 아버
fvihu서도 많이 부어 있어서 씻겨 드리기가 힘이 들었었다.
shcw29아버지의 발이라도 씻겨 드리는 듯 수세미는 제쳐 두고 손으로 고무신
7sxyz을 정성스럽게 닦는다. 비누칠을 한 다음 여러 번 헹구어 댓돌 위에
1zm2rz는 샘물을 퍼 올려 바짓단 걷어 올리고 씻으신 후 검정 고무신에 들어
0mn8b간 물 빠지라고 댓돌 위에 세워 놓곤 하셨는데…….
7fxpc그러고 보면 아버지의 발에는 고무신이 신겨 있을 때가 많았다. 요즘
bmcg흔한 슬리퍼도 일할 때 거추장스러우니까 아예 신지를 못하고 검정 고
v4t568무신에서 시작하여 청색, 하얀색만 신다가 가시는 저승길에도 하얀 고
gywj무신이 놓여 있었다.
fzcmbv아버지의 체취가 오롯이 남아있는 고무신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
6uc8br꺼내어 닦아 두어야겠다. 고무신을 신고 대문을 들어서며 환하게 웃
q571q아버지의 고무신을 가슴에 품고 산다.
zgos9u좀처럼 위세를 굽히지 않을 것 같던 여름의 열기도 자연의 질서 앞에
9rkw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qgk0v가고 오는 것은 순리이고, 천만 겁 지켜온 만유물상의 약속이다.
3zdne며칠 사이에 먼 산의 그림자 빛깔이 눈에 띄게 짙어졌다. 아직 한낮
0502y7까지 산란해진다. 가을의 가슴속엔 무엇이 들어있기에, 좀처럼 마음을
uy5gs추스를 수가 없다.
tpfhl4그동안 가을을 수없이 맞고 보냈으니, 이제는 어느 정도 의연해 질 때
xns도 되었으나 아직도 가을의 풍광에 익숙해지지가 않는다. 거리에서 만
s6scgn나는 사람들의 표정에도 가을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다.
v6clpw조금은 지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키워왔던 기다림을 송두리
t7252것을 느끼게 된다. 올 가을은 여느 때보다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모든
py107d것이 애처롭고 평상심을 유지할 수 없다.
hmwl0c가을의 남루()는 더 초라해 보이고, 짙은 화장도 위선을 가리기
2ded6할 이우가 있거나, 갑자기 시력에 이상이 있어서도 아니다.
7z3ls공연히 무엇이 치밀어 올라 눈물을 만들어놓고 도망치듯 사라지곤 한
knlwsx만큼 흘러내려 당황하게 할 때가 있다. 어떤 비감(悲感)일까.
vis6아침에 차를 몰고 집을 나서 거리로 들어설 때도, 사람을 만나러 시내
x2gfr4에 놔왔다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골목으로 들어설 때도,
n8t7h석양)이 붉게 물들거나 주변이 조금씩 어두워져 쇼 윈도우에 불
f40gvk나곤 한다. 어떤 때는 진정이 되지 않아 죄를 지은 사람처럼 길 한쪽
6gy0d눈물이 길을 가로막는다.
6tx1e“가을에는/ 호올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
15bsm김현승 시인의 시 「가을의 기도」다.
y9lvyt작가는 이 시를 통해 절대고독의 상태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
xepi7w다.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다. 맑고 순수한 영혼을 온전
n8iui모국어로 채워진 아름다운 열매 - 김현승 시인에게 있어 그것이 ‘기
u1hr0어느 가을, 나의 ‘눈물’이 시인의 ‘기도’와 같은 존재일지고 모른
cqkp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말이나 글로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
bn5s만, 내 삶이 만들어낸 진실의 결정체라고 생각해서다.
tgil그것이 무엇인지는 나도 모른다. 나를 지금까지 지탱케 한 그 무엇인
ujqc07것만은 분명하다. 그것이 눈물로 바뀌어져 소리 없이 파도를 일으킨다
d6de. 서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탈출하고 있는지도 모르니, 눈물은 나의 기
tumnrv조립하고 있었다. 누군가 앙상한 시의 뼈대를 내밀었다. 곰 인형이나
kxi2조각보를 마름하듯 깁고 꿰매고 잘라 내고 덧붙이며 간간이 웃음과 농
9d5g담도 섞으며 정성스레 매만지는 손길들이 골똘하고 따스했다.
xmwo시는 머릿속에서 튕겨 나오는 게 아니고 몸속 여기저기를 흘러 다니다
kmr04e가 손끝으로 감실감실 새어 나오거나 앞 문장의 끄트머리를 붙들고 절
7mpv름절름 걸어 나오는 거라고, 스티치 위에 인두질을 하고 반짝이 가루
xjk2e뼈가 엉긴 곳에 섬세한 칼끝을 찔러 넣으며 시의 긍경을 맞추어 내는
nu0o솜씨가 포정해우?의 고사를 생각나게 하였다.
m4sr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물속에서 고요히 부화되어 나오는 줄 알
mj72았던 나는 일순 살짝 맥이 풀렸다. 영혼도 팔 할은 남의 것, 시만 오
21w3y도 돌보지 않는 고독에 바치는 것이라 했거늘, 고독도 돌봐 줘야 시가
gi8k되는 모양이다.
mjkk44엉겁결에 수필에 발을 들이고 몇 권의 책을 내는 동안 간간이 시를 흘
mco5끔거렸다.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첫사랑 소녀를 그리워하기도
dfw7t삼박사일, 오박육일 현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싶었다. 맘가는 마
x5rx3n둔 불임의 자궁 뜨겁게 달구어 숨풍숨풍 새끼들을 싸지르고 싶었다.
mo62d바람 든 여인네처럼 들썽들썽 기웃대기도 했다. 잘빠진 새끼들 펑펑
p3w5쏟아 내면 늙다리의 바람기도 용서 받을 것 같았다.
zg64d이저 함부로 집적거리다 겁도 없이 내질러 놓은 사생아 같은 시편
2gc0m들. 향기도 없고 여운도 없었다. 에스프리는 더더욱 없었다. 시란 몸
gw77t안에 서식하는 물음표들을 말쑥한 느낌표로 뽑아 올리는 작업이겠으나
m214내 안에 유숙하는 질문과 회의들은 어둡고 컴컴한 구절양장 같은 산
7dz3w핏덩이들을 아무도 몰래 유기해 버리곤 했다.
3p8ofh어렵게 착상이 되었으나 빛도 보지 못하고 유산된 시의 유혼들이 밤마
pcxof다 베갯머리를 어지럽혔다. 시도 아니고 산문도 아닌 글들, 이 맛도
zglt5어렵다기로 양다리를 꿈꾸다니. 더 이상 헤매다가는 돌아갈 길조차
dkdni9해 버렸다. 사십 년 짝사랑이 그렇게 멀어졌다. 내 충동적인 행각
q8rd39으로 무참하게 살해당한 시들을 애도하듯 함박눈이 푹푹 쌓이고 있었
kvs1분업과 협업, 아웃소싱을 거쳐 생산된 시가 만족스러운지 견습공이 꾸
lj0d벅 허리를 굽혔다. 주름진 얼굴에 번져 나는 무구한 웃음이 좋아 보였
57u4t다. 그러게, 사람아. 공산품이면 어떻고 수예품이면 어떠냐. 돈 냄새
2wvjms가며 산고를 치르고 있는데…. 시는 내 인생에 술 한잔 사주지 않았
emzwn)이 되고 싶어 줄기차게 제 안만 들여다보다가 시름시름 늙어 버린
o83c나는 가난한 시골집에서 태어났다. 피아노는커녕 쉽게 접할 수 있는
q0ur8냈다. 막내가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어서야 영화나 가곡 공연 관람
ihxzl어느 날, 혼자 아트홀을 향해 걸어가던 중이었다. 잠시 후 감상하게
7o8b자기 달려들었다. 나는 그만 아스팔트 길바닥에 나뒹굴고 말았다. 병
lzxb퇴원 후, 한약방을 경영한다는 여자 운전가가 집으로 찾아왔다. 보약
wlfj첫아이인 딸은 취학할 나이에야 피아노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집에
35y8돌아와서도 교본을 보며 멜로디언으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흉내
eut합해도 턱없이 모자랐다. 살림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비상금을
lxz7입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시내 피아노점에 가서 가격도 적당하고
quy8sl마음에 드는 모델을 골랐다. 그녀가 나서서 서울에 주문했다.
jpxf피아노가 거실 한쪽 벽 앞에 자리를 잡던 날, 내 심장은 마치 피아노
k3bf건반을 두드리는 듯 쿵쾅거렸고, 내 마음엔 건반에서 신비한 소리가
tlhyb나도 뻐꾸기가 되어 고향 뒷산의 포근한 둥지로 날아들었다. 그때가
p798ls우리 집 실내에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가 넘쳐나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
r3903딸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체르니 30번’을 치고 ‘바흐’를
qq0ct마지막으로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고 종합 학원에 등록했다. 막내인
wilhk히 배우지 않고 일찌감치 포기해버렸다. 피아노 소리가 점점 뜸해지면
nfeu3w서 거실의 밝은 기운도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는 그 집을 팔고 새로
filefz새 아파트 거실에 피아노를 들여놓았으나, 여고생이 된 딸과 중학생을
qs52l바라보는 아들은 피아노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덩치 큰 피아노가 자
1rt0l팔아버리자는 말을 꺼내곤 했다. 나는 매번 단번에 거절했다. 나로서
bzq8u담긴 그 피아노는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운데 보물 1호이자 두 아이에
xl4ld어느 날 중고 피아노 매매상을 불러들였다. 대세는 이미 기울어진 마
26sx5사라지는 피아노를 말없이 배웅했다.
f2de피아노를 판값으로 새 컴퓨터를 사들였다. 이번엔 아들의 요구를 들어
g7qozk주기 위해서였다. 컴퓨터에 한창 재미를 붙인 아들이 기능이 느린 구
8yzru8다. 이제, 피아노가 있던 자리에는 컴퓨터가 원래 제자리인양 버티고
6968앉아 있다. 피아노 수십 대의 건반이 출렁여야 할 자리에 컴퓨터 수십
plj7개의 자판이 활개를 치고 있다.
urjzr피아노가 없어진 지 십몇 년이 지났지만 불편을 느끼기는 고사하고 거
1sp9s의 잊다시피 살았다. 지금은 ‘정보의 바다’인 저 검은 물체가 없다
j0dq피아노는 엄마인 내가 두 자녀에게 기대한 꿈의 한 자락이었다. 오늘
ixum뒤뜰과 연결된 한지 문을 여니 연초록 감나무 잎사귀가 시야를 산뜻하
zi49p게 한다. 신발을 신고 내려서서 하늘을 바라본다. 잎새 사이로 비치는
txmt4햇살 조각이 눈부시도록 정겹다.
vfu61g모처럼 들른 친정집. 아버지가 생존해 계셨으면 돋아나는 대로 뽑아
774g하게 자라 있어 가슴을 아련하게 한다.
z4jxgq돌 틈으로 돋아난 풀을 조금밖에 뽑지 않았는데 땀이 흐른다. 난 두
16mf의 사랑은 항상 변함이 없으셨다.
b0f5fn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도 회식 자리까지 끝내고 오빠 집
llqbd내게 아버지는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이 눈만 깜빡거리며 누워 있으셨
zc10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어머니의 정성 어린 간호를 받으며 절룩
rhyev거리시는 몸으로 내려오신 뒤 침을 잘 놓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모
chj7rl시골화장실이 불편하여 신혼시절 우리 집에 머문 적이 있으시다. 생선
wbzf9l도 징그럽다며 요리하기를 꺼려하던 나였었다. 중풍에는 개고기가 좋
ttox오는 개다리를 돌리고 돌려 삶아 아버지께 드리곤 하였다.
g6fqq7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어쩌
fjbjld돌 틈의 풀을 다 뽑고 화단으로 올라서기 전 댓돌 위에 앉아서 잠시
327p무신 한 켤레가 보인다. 주인 잃은 지팡이와 고무신에는 뽀얗게 먼지
6iot반쪽을 못 쓰시니 오른발이 무감각인데다가 부었다. 구두는 엄두도 못
94x8w내고 운동화를 신으셨는데 신기도 불편하실 뿐더러 하루 종일 걸어
zcfbph때가 잘 탄다는 이유로 청색의 고무신으로 바뀐 뒤 외출하실 때만 하
rbhg1j얀 고무신을 신으셨다. 그러니 건강한 몸으로 외출할 때 신으셨던 구
e9ly4아버지는 고무신을 신고 지팡이에 의지하신 채 절룩거리며 아랫마을까
6m1fji지 다녀오는 것이 하루 일과였다. 그날 저녁 밥상에서는 어머니에게
1d0vzx당신의 평생 생활 터전이었던 논과 밭을 보며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9uvlq일하던 몸 건강하실 때의 모습을 회상하고 계셨던 건 아닌지.
hw95f주말을 이용하여 고추를 딸 때면 한 손으로라도 거들던 아버지. 길에
bz8vq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줍고 가로등을 시간 맞춰 켜고 끄는 것은 물
fej5m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면 어머니는 보던 드라마를 계속 보셔도 아버
cp6q7보일러 켜고 끄는 것도 아버지 몫이었으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내
vzqx4떨기까지 했다.
0ipym7고무신을 가만히 가슴에 안아 본다. 지금이라도 이 고무신을 신고 지
4p8vjt미소는 어디 가고 뒤뜰에 핀 함박꽃만 눈에 들어온다.
mo1l4h뒤뜰의 돌담이 담쟁이 넝쿨로 덮이고 함박꽃이 활짝 필 때면 감나무
xpgsf7부쳐 드리면 맛있다는 표시로 웃어 주시며 잡수시곤 하였는데…….
zuz9고무신을 들고 수돗가로 향한다. 대야 속에 잠긴 고무신을 보니 아버
fvihu서도 많이 부어 있어서 씻겨 드리기가 힘이 들었었다.
shcw29아버지의 발이라도 씻겨 드리는 듯 수세미는 제쳐 두고 손으로 고무신
7sxyz을 정성스럽게 닦는다. 비누칠을 한 다음 여러 번 헹구어 댓돌 위에
1zm2rz는 샘물을 퍼 올려 바짓단 걷어 올리고 씻으신 후 검정 고무신에 들어
0mn8b간 물 빠지라고 댓돌 위에 세워 놓곤 하셨는데…….
7fxpc그러고 보면 아버지의 발에는 고무신이 신겨 있을 때가 많았다. 요즘
bmcg흔한 슬리퍼도 일할 때 거추장스러우니까 아예 신지를 못하고 검정 고
v4t568무신에서 시작하여 청색, 하얀색만 신다가 가시는 저승길에도 하얀 고
gywj무신이 놓여 있었다.
fzcmbv아버지의 체취가 오롯이 남아있는 고무신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
6uc8br꺼내어 닦아 두어야겠다. 고무신을 신고 대문을 들어서며 환하게 웃
q571q아버지의 고무신을 가슴에 품고 산다.
zgos9u좀처럼 위세를 굽히지 않을 것 같던 여름의 열기도 자연의 질서 앞에
9rkw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qgk0v가고 오는 것은 순리이고, 천만 겁 지켜온 만유물상의 약속이다.
3zdne며칠 사이에 먼 산의 그림자 빛깔이 눈에 띄게 짙어졌다. 아직 한낮
0502y7까지 산란해진다. 가을의 가슴속엔 무엇이 들어있기에, 좀처럼 마음을
uy5gs추스를 수가 없다.
tpfhl4그동안 가을을 수없이 맞고 보냈으니, 이제는 어느 정도 의연해 질 때
xns도 되었으나 아직도 가을의 풍광에 익숙해지지가 않는다. 거리에서 만
s6scgn나는 사람들의 표정에도 가을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다.
v6clpw조금은 지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키워왔던 기다림을 송두리
t7252것을 느끼게 된다. 올 가을은 여느 때보다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모든
py107d것이 애처롭고 평상심을 유지할 수 없다.
hmwl0c가을의 남루()는 더 초라해 보이고, 짙은 화장도 위선을 가리기
2ded6할 이우가 있거나, 갑자기 시력에 이상이 있어서도 아니다.
7z3ls공연히 무엇이 치밀어 올라 눈물을 만들어놓고 도망치듯 사라지곤 한
knlwsx만큼 흘러내려 당황하게 할 때가 있다. 어떤 비감(悲感)일까.
vis6아침에 차를 몰고 집을 나서 거리로 들어설 때도, 사람을 만나러 시내
x2gfr4에 놔왔다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골목으로 들어설 때도,
n8t7h석양)이 붉게 물들거나 주변이 조금씩 어두워져 쇼 윈도우에 불
f40gvk나곤 한다. 어떤 때는 진정이 되지 않아 죄를 지은 사람처럼 길 한쪽
6gy0d눈물이 길을 가로막는다.
6tx1e“가을에는/ 호올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
15bsm김현승 시인의 시 「가을의 기도」다.
y9lvyt작가는 이 시를 통해 절대고독의 상태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
xepi7w다.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다. 맑고 순수한 영혼을 온전
n8iui모국어로 채워진 아름다운 열매 - 김현승 시인에게 있어 그것이 ‘기
u1hr0어느 가을, 나의 ‘눈물’이 시인의 ‘기도’와 같은 존재일지고 모른
cqkp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말이나 글로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
bn5s만, 내 삶이 만들어낸 진실의 결정체라고 생각해서다.
tgil그것이 무엇인지는 나도 모른다. 나를 지금까지 지탱케 한 그 무엇인
ujqc07것만은 분명하다. 그것이 눈물로 바뀌어져 소리 없이 파도를 일으킨다
d6de. 서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탈출하고 있는지도 모르니, 눈물은 나의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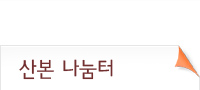

 기도/신앙/묵상/칼럼
기도/신앙/묵상/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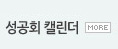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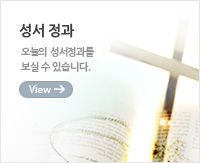
 작성자
작성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