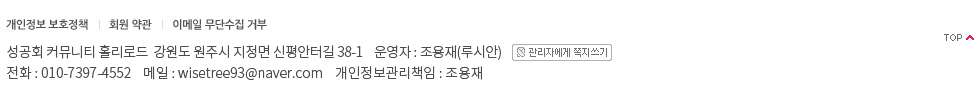20250907 여성선교주일 창세 1:17-19 / 로마 8:19-22 / 루가 23:27-28 어둠이 빛을 만날 때(When darkness meets the light) 1997년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중국언론이 ‘한류(韓流)’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이래, 오늘날 한류는 중국과 일본 및 동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도 드라마, 영화, 노래 등 대중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전 분야에 걸쳐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날이 올지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한국인이 만든 애니메이션 두 편이 전(全)세계인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812~1870)의 소설을 바탕으로 장성호 감독이 제작한 기독교 애니메이션 <The King of Kings>이고, 또 하나는 캐나다 한국교포 메기강(Maggie Kang)감독과 크리스 아펠한스(Chris Appelhans)미국감독이 공동으로 제작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약자로 ‘케데헌(KDH)’이라고 부르는 이 작품은 단순한 만화영화가 아니라, 다양한 노래가 담겨있는 뮤지컬 애니메이션입니다. 특별히, 케데헌은 한국의 아이돌을 주인공으로 삼고, 그 안에 한국의 전통문화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다양한 장소와 음식들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가히 한류의 종합판이라 하겠습니다. 얼마전부터 SNS상에 케데헌에 대한 뉴스와 감상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와서 저도 호기심에 최근 넷플릭스에서 케데헌을 봤습니다. 우선 눈에 띠는 점은 주인공이 ‘헌트리스(Huntrix)’라고 부르는 여성 3인조 보컬그룹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악한들은 ‘사자 보이즈(Saja Boys)’라고 부르는 남성 3인조 보컬그룹입니다. 이전 만화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은 슈퍼맨, 베트맨, 스파이더맨 등과 같이 남성이 주인공이고, 여성은 그러한 남성주인공을 보조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점에는 케데헌은 여성들이 활발하게 사회활동하는 오늘날 모습을 반영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백설공주와 인어공주와 같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있었다고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 리메이크한 <인어공주>와 2025년 리메이크한 <백설공주>에서 주인공들을 각각 흑인과 남미사람으로 한 바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원작을 망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을 제작한 디즈니 회사는 인종의 다양성이라는 정신을 반영했다고 했지만, 특정한 이념적 잣대로 원작을 훼손할 수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케데헌은 한국의 전통을 잘 살리면서도 그것을 현대적으로 조화시킨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눈에 띠는 것은 한국어 발음이 갖고 있는 중의(重義)적 의미를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사자보이즈에서 ‘사자’라는 발음이 ‘사자(lion)’을 뜻할 수도 있고, ‘메신저(使者)’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에서 사자 보이즈가 소개될 때는 사자모양이 나타났지만, 악령의 메신저로 활동할 때는 검은 옷에 갓을 쓰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면을 먹을 때, 라면 포장지에 우리가 먹는 신(辛)라면이 아니라, 하느님을 뜻하는 신(神)라면인 것도 같은 발음 다른 뜻을 지닌 한국말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케데헌은 자연스러우면서도 효과적으로 그리고 재미있게 한국의 언어와 전통 그리고 한국의 현대문명을 세계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많은 한국인들이 뿌듯해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케데헌에 대한 평(評)들도 대부분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문화적 측면이란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위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케데헌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 차원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하여 기독교적 시각으로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 작품은 선과 악의 대립이라는 구도로 짜여져 있습니다. 여성, 빛, 황금으로 상징되는 선(善)한 전사들은 악한 영들이 인간세계로 들어오지 못하게 혼문(魂門)을 지켜야 하고, 남성, 어둠, 우상으로 상징되는 악(惡)한 전사들은 선한 전사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혼문을 파괴하여 인간들을 더 많이 지옥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독특성은 이 사명을 수행하는 선한 여자와 악한 남자가 모두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데몬 헌터스 일원들은 각각 자신들의 나약함 그래서 숨기고 싶은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계 미국인 조이(Zoey)는 ‘골든(Golden)’이란 노래에서 “두 가지 삶을 살며 양쪽 모두에 맞춰 살려했지만, 내 자리를 찾을 수 없었어(I lived two lives, tried to play both sides, but I couldn’t find my own place)”라는 가사처럼 정체성 혼란과 위축된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미라(Mira)는 강인한 외모와 달리 가족과의 불화로 인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귀가 “가족이 생긴 줄 알았냐? 주제를 알아라!”라는 속삭임에 “그래, 내 주제에 가족이 어디있냐!”라는 자기비하로 자아가 붕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전투력과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루미(Rumi)는 인간인 어머니와 악령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로서 몸에 악령의 문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내면에 선함과 악함이 혼재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악령을 퇴치하는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는 죄의식과 수치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부족함과 결핍과 죄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악령을 퇴치하는 막중한 사명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악귀들은 그녀들이 갖고 있는 어둡고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하나씩 허물어뜨리고 그 결속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작품의 독특한 점이 돋보입니다. 그것은 악한 사명을 수행하는 사자보이즈 역시 완전한 악의 화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컨대, 사자보이즈의 리더인 진우(Jinu)는 조선시대 재능있는 악사(樂士)였는데, 출세와 부귀영화를 위해서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그 배신이 그의 양심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그는 그 죄악의 기억이란 사슬에 묶여 지옥을 배회하는 가련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탈출하고 싶어서 악마에게 헌트릭스를 무력화시키고 혼문을 무너뜨려 인간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면, 자신에게 있는 죄책감의 기억을 지워달라고 합니다. 마치 단테의 소설 <파우스트(Faust)>에서 인간 파우스트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Mephistopheles)에게 자신의 영혼을 파는 거래를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루미를 만나고 자신이 속죄하는 길은 배신의 기억에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속죄해야만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럼으로써 마침내 자신도 영원한 악의 굴레로부터 해방됩니다.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이며 사제이기도 한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핏 보면, 이 작품은 고도로 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가 누리고 있는 화려한 대중음악과 소비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등장인물들은 서양인이 아닌 한국인입니다. 또한 한국적인 요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스토리에는 상처받은 인간의 모습, 죄의 유혹에 빠질 위험에 노출된 인간들, ‘너의 아이돌(Your Idol)’이란 노래처럼 각자가 설정한 우상에 매몰되고 열광하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 넘기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은 악을 이기는 출발점은 자신안에 감춰진 어둠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바로 그 소리야(What it sounds like)’라는 노래에서 “하지만 이제 우리는 깨진 유리 속 아름다움을 본다. 상처는 나의 일부. 어둠과 조화, 거짓 없는 내 목소리, 이게 그 소리야(But now we're seeing all the beauty in the broken glass. The scars are part of me, darkness and harmony. My voice without the lies, this is what it sounds like)”라는 가사는 이 점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하느님, 내 제물은 찢어진 마음뿐, 찢어지고 터진 마음을 당신께서 얕보지 아니하시니” (시편 51:17)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어둠을 깊이 직시할 때, 하느님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는 은총도 풍성하게 내렸습니다.”(로마5:20)라고 하시면서 하느님의 빛으로 어둠을 초월하는 구원의 신비를 설명하십니다. 그럴 때,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공동체는 깨지지 않고 오히려 다시 하나가 되며,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케데헌은 기독교적 구원론과 인간론이 담긴 뛰어난 대중문화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융복합(Convergence and Integration)’이란 말은 시대적 화두(話頭)가 되었습니다. 전화, 카메라, 인터넷이 핸드폰 속에 하나로 통합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