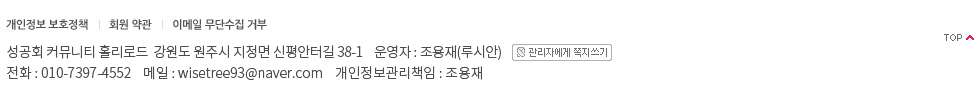20251006 추석 요엘 2:21-24, 26 / 1요한 3:17-18 / 마태 25:34-40 제사의 의미: 공경과 감사와 나눔 추석과 설은 우리의 대표적 명절입니다. 중국에서도 이것을 중추절(仲秋節)과 춘절(春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같은 명절이라도 추석과 설은 좀 다릅니다. 설은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라면, 추석은 한 해 동안 땀흘려 가꾼 곡물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성질의 명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두 명절 모두 제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공통 요소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것을 하지 않는 집안이 점점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유가 문명 아래에 있는 우리나라나 중화권 지역에선 조상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전통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석과 명절에 조상에 지내는 제사를 흔히 ‘차례(茶禮)’라고 부릅니다. 한자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는 차(茶)를 올리는 간소한 예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와서 명절 때 드리는 차례를 기제사(忌祭祀)처럼 드리면서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여기서 기제사란 부모를 비롯한 조상들이 돌아가신 그날에 드리는 제사를 뜻합니다. 우리가 제사상 차릴 때 흔히 듣던 원칙, 어동육서(魚東肉西), 좌포우혜(左脯右醯), 조율이시(棗栗梨柿)와 같은 제사상 차리는 것이 그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 친가는 완고한 유가 집안이라서 추석과 설 차례는 물론 4대조까지 기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 속에는 제사상을 차리느라 고생하셨던 어머니 모습과 제사 지내기 위해 자다가 일어나야 했던 추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저에게 제사란 여성들을 괴롭히는 나쁜 전통이라는 인상이 남았습니다. 그에 반해 천주교 집안인 외가는 명절이나 기일이 되면 별세기념미사에 참례했는데, 제사를 준비하는 수고로움이 덜해서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성인이 돼서 신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동시에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면서 어렸을 때 느꼈던 불편하다, 편하다 하는 피상적 차원을 벗어나 제사를 통해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원의 그리고 이것을 초월자와 연결하는 그리스도교의 정신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고 깊은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 여러분과 함께 제사에 대하여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이해하고 승화할 수 있는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사란 공경의 예절입니다. 유가에선 부모를 공경하는 孝(효)를 임금에 대한 忠(충)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충이 공동체, 즉 나라의 근간이 되는 존재에 대한 변치않는 마음이라면, 효란 나를 있게 한 부모와 조상에 대한 감사와 공경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물론, 그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고마움을 기억하며 감사와 공경의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윤리의 핵심인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여라”(출애 20:12)라는 계명이 있듯이, 부모와 조상에 대한 공경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이 효를 단지 인간적 차원으로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듯이, 하느님은 모든 인간을 있게 만드신 원초적인 부모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이 하느님께 공경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사는 감사의 예절입니다. 우리 성공회는 이 예배를 그리스말 ‘유카리스트(εὐχαριστ)’를 번역해서 ‘감사성찬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이 예식을 통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구체적 행위가 바로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고 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먹는다는 것은 실제적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가 전통에 기반한 제사에서도 감사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조상께 드리고, 이러한 음식을 마련해 준 조상의 은덕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그 차이는 그리스도교처럼 축성이라는 거룩한 초월적 차원으로까지 넘어가지 않고, 이 현세에서 거둔 결실에 대하여 조상께 감사드리는 현세적 차원으로 국한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는 나눔을 향합니다. 제사나 차례를 지내고 나서 음복(飮福)을 합니다. 그때 가족들은 모두 모여 앉아 제사 때 드린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겁게 지냅니다. 우리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제는 축성된 빵과 포도주를 신자들에게 나눠주고 신자들은 그것을 영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예배 후 일상으로 돌아가서 주변과 나눕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켜 온 명절차례와 제사를 그리스도교 예배와 비교해서 통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랜 세월을 걸쳐 우리 삶에 녹아든 제사는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보면 배척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보완되어야 할 풍속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여러모로 강한 신앙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아테네 시를 돌아다니며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을 살펴보았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한 채 예배해 온 그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도 17:22-23) 사도 바울은 이처럼 그들 안에 있는 종교심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들이 찾는 궁극적 존재가 하느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아테네 사람들의 풍속을 하찮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면서 그것을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인도한 훌륭한 선교 모범인 것입니다. 대한성공회는 선교 초기부터 강화한옥성당을 통해 우리의 전통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해서 그것을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훌륭히 녹여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도 바울의 선교를 가장 잘 계승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통명절인 차례를 대할 때, 피상적 모습을 보고 판단하기에 앞서 태초에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진리의 씨앗이라는 관점에서 그 속에 담긴 선한 측면을 살리고, 그것을 초월적이고 영원한 진리로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별세 기념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있게 해 주신 조상들을 기억하고, 지금 나와 그분들의 궁극적인 조상이신 하느님께 감사와 공경을 드립시다. 그리고 하느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감사히 받고, 그 기쁨을 주변 식구들과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